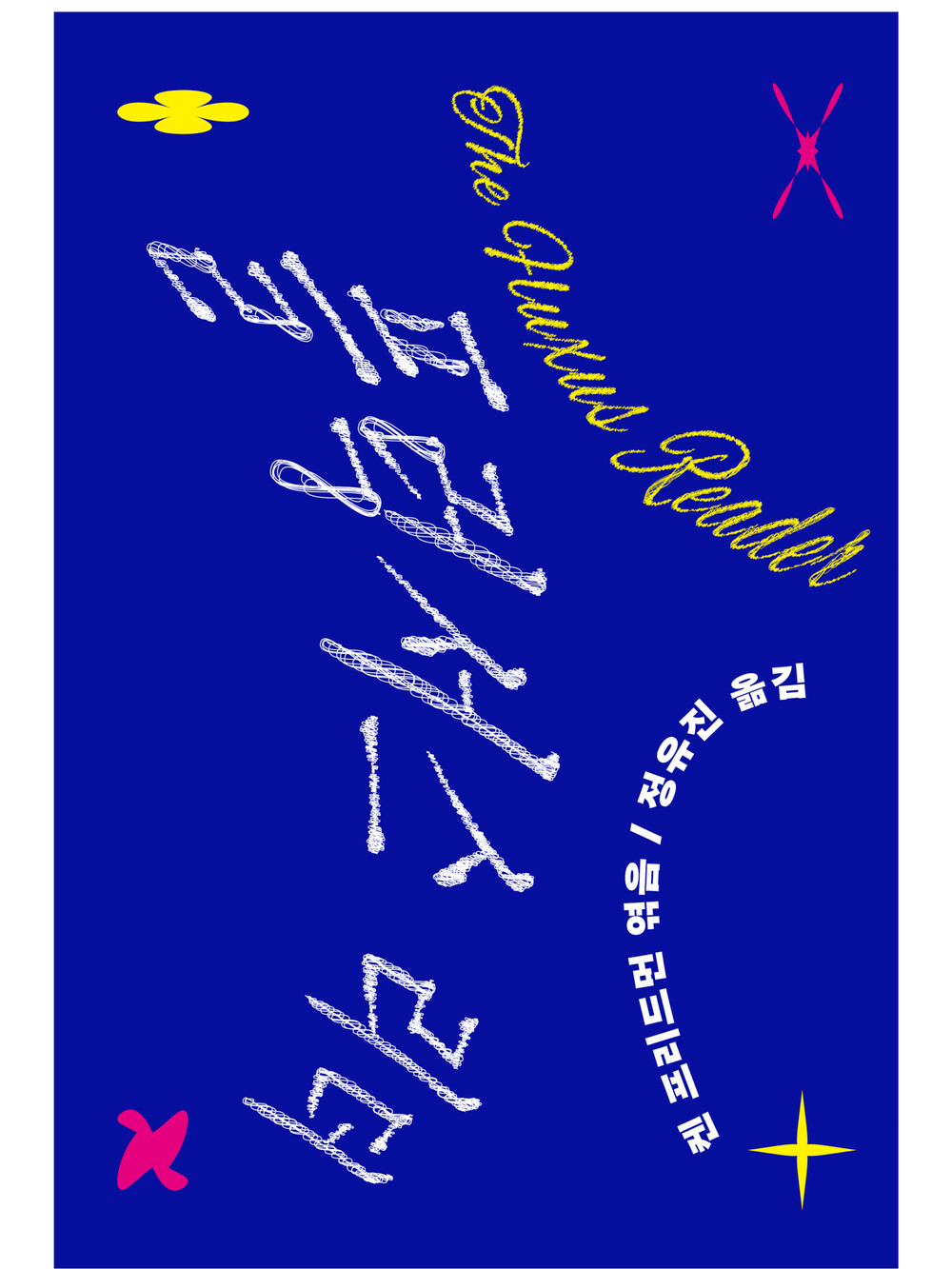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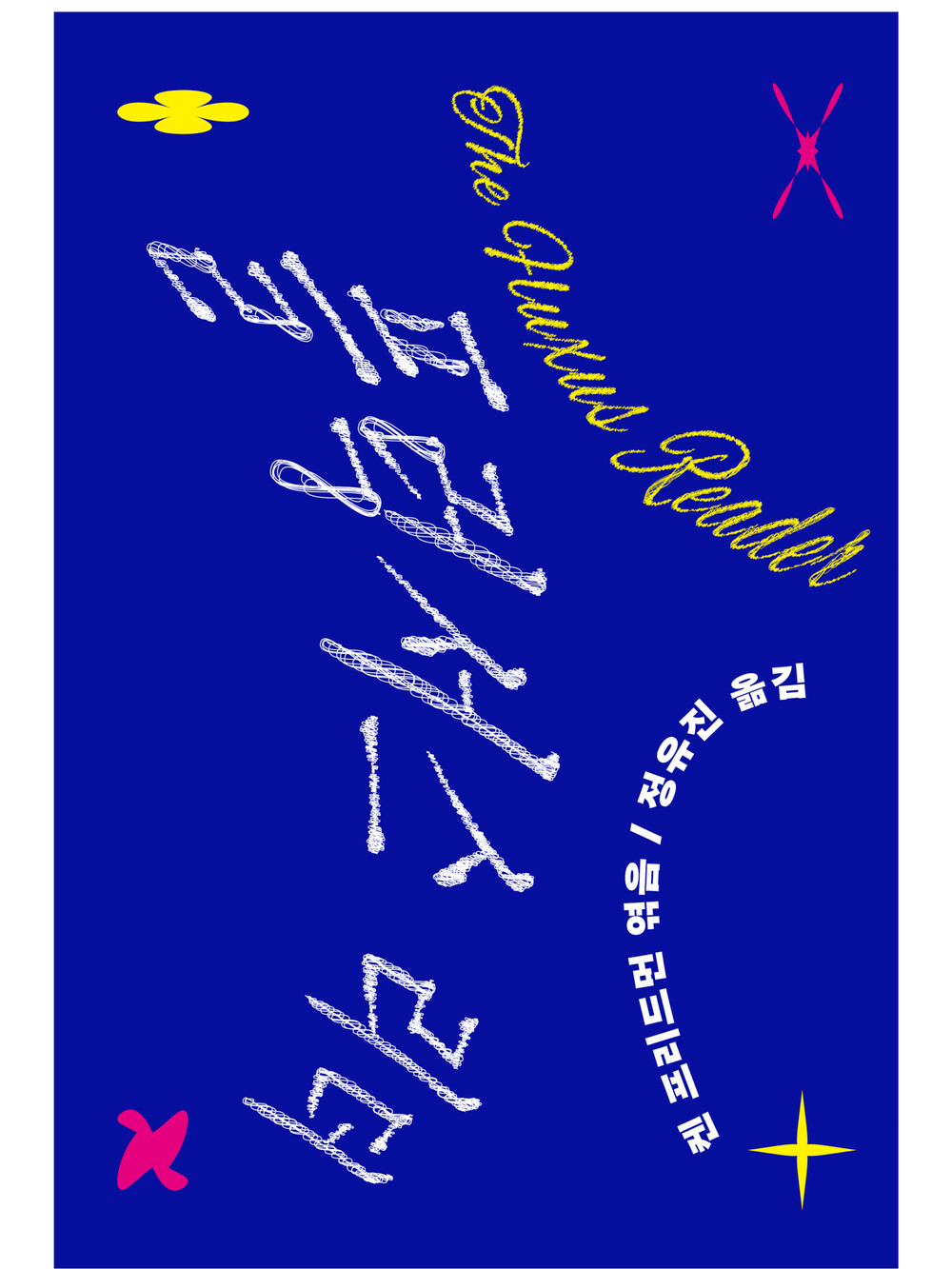











20세기의 혁명적 예술운동이자 백남준의 참가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플럭서스를 13명의 목소리로 만난다.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문 실험 정신과 그 여정.
역사, 이론, 그리고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 플럭서스의 다양한 통찰과 도전을 담아낸 결정판! 현대 예술의 혁신을 이끈 플럭서스의 정신과 실천을 총망라한다.
플럭서스는 창의적인 개그다. 그것은 시각적 개그만이 아니라 소리 개그, 오브제 개그, 모든 종류의 개그를 한다. ― 조지 마키우나스
간략한 소개
1960년대 태동한 플럭서스는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며 등장했다. 켄 프리드먼이 엮은 『플럭서스 리더』에서는 13명의 플럭서스 예술가, 역사가, 비평가들이 플럭서스에 대한 다각도의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 책은 1960년대 초기 플럭서스 페스티벌부터 1990년대까지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며, 역사적 기록, 이론적 분석, 비평적 시각을 종합한다. 조지 마키우나스, 딕 히긴스와 같은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플럭서스가 어떻게 예술가와 예술 자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는지 보여주며, 다다이즘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으로까지 이어지는 예술사적 맥락 속에서 플럭서스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이 책은 래리 밀러와 조지 마키우나스가 나눈 플럭서스 초창기에 관한 대화, 그리고 빌리 마키우나스가 수잔 자로시와의 인터뷰에서 들려주는 마키우나스와의 개인적 경험을 최초로 소개하여, 플럭서스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플럭서스는 역사의 한순간이나 예술 운동이 아니다. 플럭서스는 무언가를 하는 방식이며, 전통이며, 삶과 죽음의 방식이다. 플럭서스는 양식적, 이데올로기적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포장하거나 도서관 책장에 가지런히 놓을 수 있는 유형의 ‘예술가’ 그룹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계를 철학적 실천의 장으로 만들었고 멀티미디어, 통신, 하이퍼텍스트, 산업 디자인, 도시 계획, 건축, 출판, 심지어 경영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고 실현할 수 있게 했다.
놀이정신은 처음부터 플럭서스의 일부였다. 과학적 실험에서도 장난에서도 나타나는 아이디어의 놀이, 자유로운 실험의 놀이, 자유 연상의 놀이,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의 놀이는 유머를 훨씬 넘어선다. 또 플럭서스 작품은 악보처럼 설계되어, 창작자가 아닌 다른 예술가들도 실현할 수 있다. 음악성은 플럭서스의 핵심 개념이다. 연극 복장을 한 퍼포머가 머리로 바이올린을 치고, 색소폰 케이스에서 어이없게 트럼펫이 나오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일렬로 서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벽에 머리를 찧고 ‘퍼포머’가 아니라 관객이 탱고를 추고 구두를 신고 한쪽 발을 구른다. 플럭서스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공연이 가졌던 개념은 조롱되고, 전복되고 쫓겨난다. 플럭서스 작품의 불손한 기행은 예술의 신성함이라는 이기적인 개념을 경멸한다.
상세한 소개
플럭서스란 무엇인가?
플럭서스는 1960년대에 시작된 혁신적인 예술운동으로, 예술가와 작곡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기도 했다. ‘흐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플럭서스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자 주요 조직가였던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예술가 조지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의 목적을 “예술의 혁명적 흐름을 촉진하고, 생활 속의 예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럭서스는 실험 음악에서 출발했지만, 곧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움직임으로 발전했다. 1961년 뉴욕에서 첫 행사를 한 후, 뉴욕,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미술관에 걸린 그림이나 콘서트홀의 음악만 예술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들은 일상적인 행동을 예술로 만들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었으며, 우연과 유머를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였다. 오노 요코, 백남준, 요셉 보이스와 같은 혁신적인 예술가들이 이끈 이 운동은, 기존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 형식을 실험했다.
플럭서스의 실험정신과 민주적인 예술관은 오늘날 현대예술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들이 추구한 ‘일상 속의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생각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었으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현대예술의 주요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책을 엮은 켄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프리드먼은 영향력 있는 플럭서스 연구자로서, 예술가와 학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해 플럭서스의 실천과 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지 마키우나스와 함께 활동하며 플럭서스 운동의 발전에 깊이 관여했고,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플럭서스 운동의 발전과 연구에 헌신해 왔다.
프리드먼의 작품들은 플럭서스의 핵심 가치인 단순성, 유머, 그리고 일상과 예술의 결합을 잘 보여주며,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학자로서 프리드먼은 멜버른 스윈번 대학교 디자인 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예술경영, 디자인, 그리고 플럭서스 연구 분야에서 활약했다. 그의 연구는 플럭서스를 단순한 예술운동이 아닌, 20세기 후반 예술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렌즈로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플럭서스의 이론적 토대를 체계화하고, 이를 현대 예술 및 디자인 교육과 연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프리드먼은 플럭서스를 직접 경험한 참여자이자, 동시에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관찰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의 저술과 연구는 플럭서스에 대한 실천적 이해와 이론적 분석을 결합하여, 현대 예술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도 그는 지속적인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플럭서스의 유산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플럭서스 연구의 결정판 『플럭서스 리더』
『플럭서스 리더』는 플럭서스 운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서로서, 현대 예술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지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럭서스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둘째, 플럭서스 운동의 주요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함께 담아, 이 운동에 대한 내부자적 시각과 학술적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셋째, 플럭서스가 현대 예술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이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요셉 보이스, 딕 히긴스, 앨리스 허친스, 오노 요코, 백남준, 벤 보티에, 로버트 와츠, 벤저민 패터슨, 에밋 윌리엄스 등 1960년대 주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활동을 포함하여,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부터 현대 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현대 예술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이 플럭서스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현대예술의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정유진 역자는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고 “수많은 연구서를 읽어왔지만, 이 책은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예술을 사고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이 책은, 제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플럭서스에 대해 이처럼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번역 출간이 국내 예술계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예술가이고, 예술가이기를 강요받고 있는 ‘예술인간의 시대’에,
‘플럭서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플럭서스의 민주적 예술관은 오늘날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가는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플럭서스가 추구했던 일상과 예술의 경계 허물기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창의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깊은 영감을 준다. 그러나 플럭서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창작 행위’를 넘어선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플럭서스는 이러한 강제된 창의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본질적인 창조성을 추구했다. SNS와 콘텐츠 생산에 집중된 현대의 ‘창작 강박’에 대해, 플럭서스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 ‘존재 자체가 예술’이라는 해방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플럭서스는 예술을 통한 저항과 해방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현대인이 겪는 성과주의와 경쟁 구도, ‘생산성’과 ‘효율성’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플럭서스가 강조하는 공동체적 예술 실천이다. 개인의 ‘인플루언서화’가 아닌, 집단적이고 참여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 소통, 공유의 가치를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플럭서스는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백남준의 작업은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되 인간성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실제’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플럭서스는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공한다. ‘좋아요’와 ‘조회수’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콘텐츠 상품화’를 넘어, 예술이 삶의 본질적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현대인의 무감각해진 일상 감각을 깨우고, 평범한 순간들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
결국 플럭서스는 ‘예술적 삶’이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아닌,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이는 예술가가 ‘되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예술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플럭서스와 정치, 플럭서스와 사회
플럭서스와 정치, 사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으며, 이는 플럭서스가 단순한 예술운동이 아닌 사회문화적 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회적 측면에서 플럭서스는 무엇보다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강하게 거부했다. 미술관과 갤러리로 대표되는 제도화된 예술 시스템에 도전하며, 예술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이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상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고, 이를 통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플럭서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냉전 시기에 동서양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 소통을 추구했다는 점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태도는 예술을 통한 평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플럭서스 작가들의 활동은 직접적이었다. 요셉 보이스는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녹색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쳤다. 많은 플럭서스 예술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와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힘을 입증했다. 플럭서스의 정치성은 기존 예술 제도와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상업화된 예술 시장과 제도화된 미술관 시스템에 도전하며, 대안적인 예술 제작과 유통 방식을 모색했다. 값비싼 재료 대신 일상적 사물을 사용하고, 복제와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등 예술의 민주화를 실천했다.
이처럼 플럭서스의 사회정치적 성격은 예술운동이 단순히 미학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들의 실천은 오늘날 사회참여 예술이나 공동체 예술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플럭서스 예술가 백남준
백남준은 한국에서 주로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예술 세계는 훨씬 더 깊고 다면적이다. 특히 플럭서스 운동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백남준의 면모는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백남준의 활동과 사상을 플럭서스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선 백남준의 실험정신은 플럭서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의 초기 퍼포먼스와 음악 실험들은 플럭서스의 핵심 가치인 장르의 경계 허물기, 우연성의 수용,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와 같은 작품에서 보이는 파격적 실험정신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플럭서스의 예술철학이 구현된 것이었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관은 동서양의 문화적 감수성을 독특하게 융합했다. 그는 선(禪)적 사고와 서구 아방가르드를 접목시켰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창조했다.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동양적 사유의 만남, 테크놀로지와 인간성의 조화는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백남준은 일찍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전자 초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을 통해 글로벌 소통의 시대를 예견했으며, 이는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테크놀로지와 인간성의 조화라는 그의 비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또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교류에 대한 그의 선구적 통찰은 글로벌 시대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백남준의 생각도 더 깊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는 테크놀로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 보았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유머와 따뜻한 인간애는 차가운 기술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백남준의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의 기술적 혁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술철학과 문화적 비전, 그리고 플럭서스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플럭서스 예술가와 작품들 : 딕 히긴스와 앨리슨 놀스
마지막으로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여러 플럭서스 멤버 중에서 딕 히긴스와 앨리슨 놀스의 작품에 관해 살펴보자.
딕 히긴스는 ‘인터미디어’(Intermedia)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예술가이다. 1966년 그가 발표한 「인터미디어 선언문」은 오늘날 융합예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시각예술, 음악, 퍼포먼스, 출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고, 섬씽 엘스 프레스(Something Else Press)를 설립하여 실험예술 출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그의 <위험 음악>(Danger Music) 시리즈는 음악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는데, 예를 들어 <위험 음악 17번>(Danger Music Number Seventeen)은 “한밤중에 소리 지르기”라는 단순한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상적 행위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술이 특별한 기술이나 재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플럭서스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앨리슨 놀스는 플럭서스의 주요 여성 예술가로서, 특히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였다. 그녀의 대표작 <샐러드를 만드시오>(Make a Salad, 1962)는 샐러드를 만드는 일상적인 행위를 퍼포먼스로 변환시킴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미술관에서 재연되고 있으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플럭서스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녀의 <커다란 책>(The Big Book, 1967)은 관객이 직접 페이지 안을 걸어 다닐 수 있는 8피트 크기의 책으로, 책이라는 매체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혁신적인 작품이다.
엮은이
켄 프리드먼 Ken Friedman, 1949~
플럭서스 예술가이자 학자로, 실험적 예술, 건축, 디자인,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1966년 플럭서스에 합류하여 초기 멤버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테이트 모던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주요 저서로는 『플럭서스 퍼포먼스 워크북』(2002, 공저), 『인터미디어, 플럭서스, 섬씽 엘스 출판사 : 딕 히긴스의 선집』(2018, 공저)이 있다. MIT 출판사 『디자인 싱킹, 디자인 이론』 저널과 퉁지대학의 She Ji 저널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노르웨이 경영대학과 덴마크 디자인 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중국 퉁지대학 디자인 이노베이션 석좌교수와 오스트레일리아 스윈번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이
정유진 Chung You Jin, 1977~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 서양 예술사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 “Fluxus and the Zen Buddhist's concept of Emptiness”를 통해 플럭서스와 선불교의 공(空) 개념을 연구했다. 국제 학술지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rts in Society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같은 저널의 부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 “Yoko Ono's Cut Piece as a participation work”, “The Unity of Art and Life : The Synthesis concept of Fluxus and Zen” 등이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서출판 의제 대표로 일했으며, 2021년 제4회 Gravity Effect 미술 비평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글쓴이
오언 스미스 Owen F. Smith
오언 스미스는 1958년 이후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작품들을 시도해 왔다. 80여 개가 넘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근현대, 특히 대안적 예술 형식들에 관심이 많다. 그의 대표 저서인 Fluxus : A History of an Attitude (1998)는 다다, 플럭서스, 미술 이론과 미술사를 다룬다. 스미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강의하며, 미국 메인대학교 인터미디어 MFA 프로그램 교수로 있다.
사이먼 앤더슨 Simon Anderson, 1958~
영국 출신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카고 예술대학 부교수로 있다. 1988년 런던 왕립 예술학교에서 1972년 전시회 <플럭스슈>(Fluxshoe)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실험 예술을 주제로 강연해 왔다. 플럭서스, 메일 아트,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개념 사진에 대한 비평문, 서평, 책을 저술했다. 또한 플럭서스 예술가이자 메일 아트와 퍼포먼스의 주창자로, 플럭서스 이벤트와 콘서트를 계속해 오고 있다. 1993년 플럭서스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시회 <플럭서스 정신으로>의 카탈로그에는 예술가들이 그룹을 형성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1962년부터 1978년까지의 퍼포먼스 사진과 작업 활동을 담고 있다. 이 카탈로그에 실린 앤더슨의 글은 마키우나스가 가졌던 출판에 대한 급진적인 관점을 다룬다.
한나 히긴스 Hannah Higgins, 1964~
플럭서스 예술가 딕 히긴스와 앨리슨 놀스의 딸로,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후기 개념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한다. 특히 ‘정보’와 ‘감각’이라는 두 가지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연구한다. 주요 저서로는 Mainframe Experimentalism : Early Computing and the Foundations of Digital Art (2012), The Grid Book (2009), 『플럭서스 경험』(2002 [2024])이 있으며,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나 블롬 Ina Blom, 1961~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미술사학과 교수이며, 시카고 대학 미술사학과 객원교수이다. 블롬은 평론가로서 Artforum, Frieze, Parkett, Afterall, Flash Art 등 국제 미술 전문지에 기고하고 있다. 미디어 미학과 기술, 미디어, 정치 사이 관계에 중점을 두어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를 연구한다.
데이비드 T. 도리스 David T. Doris
1983년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우스햄튼 칼리지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뉴욕의 헌터 칼리지와 예일 대학에서 예술사를 공부했다. 그는 이 책에 실린 「선 보드빌」뿐만 아니라 1992년 <플럭서스 바이러스> 전시회 카탈로그에 게재된 “Zen and Fluxus? Shut My Mouth!” 등 선과 플럭서스를 주제로 다양한 글을 집필했다. 2009년부터 미시간 대학교에서 예술사, 아프리카 연구, 예술 및 디자인과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크레이그 세이퍼 Craig Saper
뉴미디어, 영화, 문화 이론, 실험 시에 대해 30여 개가 넘는 저널, 카탈로그 에세이, 리뷰 등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The Amazing Adventures of Bob Brown (2016), Intimate Bureaucracies (2012), Networked Art (2001), Artificial Mythologies (1997)가 있으며, 이외에도 플럭서스와 시각 시에 대해 많은 글을 집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로 있다.
에스테라 밀만 Estera Milman
미술사학자이자 큐레이터, 아방가르드 연구자였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와 아이오와 대학에서 사진, 역사 비평과 이론을 공부한 후,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특히 스탠리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1982년 <현대미술의 대안 전통 연구소>(ATCA)를 설립하고, 1992/1993년에는 플럭서스 3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 <플럭서스 : 개념 국가>를 기획했다. ATCA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품을 수집하여 전시했는데, 여기에는 조지 마키우나스, 존 케이지, 오노 요코, 딕 히긴스, 켄 프리드먼 등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ATCA는 일회성 작품과 퍼포먼스 공연 관련 전시와 물건들로 현대 미술작품과 연구에 기반이 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밀만의 주요 저서로는 Through the Looking Glass : Dada and the Contemporary Arts (1988), Fluxus and Friends, Selections from the Alternative Traditions in the Contemporary Arts Collection (1988), The Avant-Garde and the Text, Visible Language (1988), Art Networks and Information Systems : A Source Book and Miscellany (1990)가 있다.
스테판 C. 포스터 Stephen C. Foster, 1941~2018
아트 딜러, 아트 비즈니스 컨설턴트, 큐레이터, 학자로서 연구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1980년대 뉴욕의 미술 컨설팅 회사인 FACS에서 일하며 20세기 미술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포스터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전시회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미국 국립 인문 재단, 국립예술기금, 스미스소니언, 게티, 멜론 재단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미술과 20세기 전반 예술 분야를 다룬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글을 쓰며 20세기와 21세기 예술 분야를 연구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하며 다다 아카이브와 연구소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니콜라스 저브러그 Nicholas Zurbrugg, 1947~2001
학자, 비평가, 시인, 큐레이터, 예술가였다. 현대미술과 문화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멀티미디어, 아방가르드와 플럭서스 이론, 시, 비디오 아트, 영화 제작, 퍼포먼스, 철학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는 스위스 뇌샤텔에 있는 대학과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옥스퍼드 세인트 존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주요 저서로는 The Parameters of Postmodernism (1993), Jean Baudrillard : Art and Artefact (1997), The ABCs of Robert Lax (1998), Critical Vices : The Myths of Postmodern Theory (1999) 등이 있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그리피스 대학에서 비교문학 학자로 재직했고, 이후 영국 드 몽포트 대학에서 영어와 문화 연구 교수로 재직하며 현대미술 센터의 소장을 역임했다. 저브러그는 실험적 작품을 도전하는 예술가들을 지지하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다.
래리 밀러 Larry Miller, 1944~
미국 출신으로 뉴욕 럿거스 대학교에서 로버트 와트의 수업을 듣고 그의 영향을 받았다. 1969년 조지 마키우나스를 만나면서 플럭서스에 합류했으며, 퍼포먼스와 실험적 설치미술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접목했다. 독창적인 작곡을 플럭서스 스코어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플럭서스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이를 조직하고 플럭서스 자료를 수집했다. 밀러의 초기 작품들은 실험적 예술과 경험을 연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오브제와 이벤트 사이, 시간과 공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했으며, 특히 예술, 과학, 종교와 같은 주제가 정해진 규범 안에서 행해지는 관습적 작업을 거부했다. 예를 들면 과학적 주제와 예술 형태 사이를 오가는 작업으로, 유전학 기술과 DNA를 새로운 예술 매개체로 사용했다. 또한 밀러는 유전학뿐 아니라 이벤트, 퍼포먼스, 인터뷰를 비디오로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인터뷰 기록에는 조 존스, 캐롤리 슈니먼, 벤 보티에, 딕 히긴스, 앨리슨 놀스의 영상이 있으며, 특히 『플럭서스 리더』에 실린 조지 마키우나스와의 대화가 가장 유명하다.
수잔 L. 자로시 Susan L. Jarosi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저널에 글을 기고하고,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으며, The Art of Experience : Fluxus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Michael Lowe (2009) 전시회의 카탈로그의 에디터로 참여했다. 현재 미국 루이빌 대학에서 미술사, 여성, 젠더 분야를 가르치며 부교수로 있다.
딕 히긴스 Dick Higgins, 1938~1998
영국 출신으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맨해튼 인쇄학교(Manhattan Graphic Center)에 다니며 존 케이지의 수업을 들었다.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전자음악을 시도했다. 1962년 독일 플럭서스 페스티벌에 동료 앨리슨 놀스와 함께 참여하고, 1963년 섬씽 엘스 프레스를 설립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최초로 컴퓨터를 접하고, 컴퓨터를 예술 도구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미디어’라는 용어를 예술 작업에 처음 접목했고, 1966년 에세이 “Intermedia”에서 이를 정의했다. 히긴스는 인터미디어와 <위험 음악>의 스코어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저서 47권을 출간하거나 편집했다.
켄 프리드먼 Ken Friedman, 1949~
플럭서스 예술가이자 학자로, 1966년 플럭서스에 합류하여 1960년대에 초기 플럭서스 멤버들과 함께 작업했다. 그는 실험적 예술, 건축, 디자인,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수십 년 동안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테이트 모던 등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저서로는 오언 스미스와 공저한 Fluxus Performance Workbook (2002), 스티브 클레이, 하나 히긴스, 딕 히긴스와 공저한 Intermedia, Fluxus and the Something Else Press : Selected Writings by Dick Higgins (2018)가 있다. 또한 MIT 출판사의 Design Thinking, Design Theory 저널과 퉁지대학의 She Ji 저널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경영 대학과 덴마크 디자인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중국 국립 종합대학인 퉁지 대학에서 디자인 이노베이션 석좌교수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스윈번 공과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책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조지 마키우나스는 나에게 플럭서스 역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1966년 가을이었다. 당시 나는 열여섯 살이었고 학업을 잠시 중단한 채 뉴욕에 살고 있었다. 조지는 그해 8월 나를 플럭서스 명부에 올려놓았다. ― 서문, 8쪽
저녁 8시,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에서 미술평론가이자 미술관 관장인 장-피에르 빌헬름의 사회로 첫 번째 ‘페스툼 플룩소룸 플럭서스’가 열렸다. 무대 앞을 가로지른 거대한 흰 종이가 무대를 가리고 있었고, 빌헬름은 무대 왼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준비한 대본을 읽었다. ― 플럭스(Flux)-가능한 포럼을 발달시키기, 15쪽
1970년대는 플럭서스 역사의 첫 기념탑이라 할 만한 ‘해프닝과 플럭서스’ 전시 및 카탈로그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해프닝은 국제적, 공식적으로 눈에 띄는 문화 현상이었다. ― 플럭서스, 플럭션, <플럭스슈>, 51쪽
매우 가난하던 시절에 조지 마키우나스는 식료품점에서 라벨이 다 떨어져 나간 통조림 음식을 사곤 했다. 당연히 그런 통조림들은 할인을 많이 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마키우나스와 함께하는 식사는 한 편의 모험이었다. ― 플럭서스 포르투나, 123쪽
백남준은 테크놀로지 장치들이 어떤 안정적인 기계적 혹은 재생산적 형태로도 남아있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장치가 끊임없이 변형될 정도로까지 테크놀로지 자체를 소리의 개념과 동일시하곤 했다. 백남준의 장치들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거나 만들어 내지 않고 쉴 새 없이 소리를 재구성했다. ― 지루함과 망각, 156쪽
플럭서스 참여자들은 사실 플럭서스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처럼 동의하지 않았다. 플럭서스는 또한 다른 운동과 달리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최초의 진정한 전지구적 아방가르드로 여겨질 만했다. 플럭서스 작품의 창작에 참여한 예술가, 작곡가, 시인 등은 프랑스, 서독, 일본, 한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미국 출신이었다. 이들 중 몇몇은 국외 거주자로 살거나 유목민으로 살았다. ― 선 보드빌, 179~180쪽
마키우나스는 플럭서스가 “하나의 예술 형식이라기보다는 일을 해 나가는 방식에 더 가깝다”라고 설명한다. “플럭서스는 개그 … 다분히 독창적인 개그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반복하며 여기에 수반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 플럭서스 실험실, 285쪽
플럭서스의 모든 참여자들이 당시 행동주의자나 정치 참여 예술가 명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예술 창작을 문화적, 사회정치적 비판과 통합하려는 아방가르드의 오랜 책임을 정기적으로 수행했다. ― 플럭서스 역사와 초-역사, 299쪽
유연한 목표가 집단의 생존을 가능케 한 방식을 언급하며 백남준은 플럭서스를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진 이삼십 명의 예술가들이 좋은 우정을 유지하며 협력했던,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나키스트적 집단들 중 하나”로 설명한다. ― “큰 목표를 지닌 정신”, 329쪽
래리 밀러 : 당시 예술계에 유머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지 마키우나스 : 그렇습니다. 미래주의 시대에도 유머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진지한 선언문을 매우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반면 우리는 재미있는 선언문을 만들어냈죠. ... 우리가 만든 많은 박스들, 필름들,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음식 …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매우 유머러스했어요. 심지어 미사처럼 진지한 것도 결국에는 유머러스해졌죠. ― 조지 마키우나스와의 비디오 인터뷰 녹취록, 1978년 3월 24일, 357쪽
저는 여전히 플럭스오브제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조지도 저에게 플럭스오브제였습니다. 그는 시적 오브제, 시적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그 결혼이 왜 저를 위한 결혼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제게는 진정한 결혼이었어요.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 빌리 마키우나스와의 인터뷰 발췌문, 388쪽
어쩌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플럭서스적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플럭서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부터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어쩌면 플럭서스, 390쪽
우리는 각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놀스, 포스텔, 브레히트는 원래 화가였고, 와츠는 조각가, 패터슨과 나, 백남준은 작곡가, 빌헬름과 나, 맥 로우는 작가인 식이었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모두 플럭서스 사람이라 불렀던 것이다. ― 플럭서스 : 이론과 수용, 401쪽
플럭서스 그룹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때는 1962년이다. 당시 유럽, 일본, 미국에서 여러 예술가들이 유사한 예술 형식으로 작업하며 동일한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 리투아니아 태생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였던 조지 마키우나스가 이들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플럭서스』라는 잡지를 통해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지만 갤러리는 문을 닫았고 잡지는 출간되지 못했다. ― 플럭서스와 동료들, 441쪽
목차
엮은이 한국어판 서문 6
서문 : 플럭서스의 혁신적 비전 · 켄 프리드먼 8
1부 세 가지 플럭서스 역사
플럭스-가능한 포럼을 발달시키기 : 초기 퍼포먼스와 출판 / 오언 스미스 16
플럭서스, 플럭션, <플럭스슈> : 1970년대 / 사이먼 앤더슨 50
플럭서스 포르투나 / 한나 히긴스 67
2부 플럭서스 이론들
지루함과 망각 / 이나 블롬 126
선 보드빌 : 플럭서스의 가장자리에서 하는 매개/명상 / 데이비드 T. 도리스 178
플럭서스 실험실 / 크레이그 세이퍼 260
3부 비평적·역사적 관점들
플럭서스 역사와 초-역사 :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전략들 / 에스테라 밀만 292
역사적 설계와 사회적 목적 : 플럭서스와 모더니즘의 관계에 대한 주석 / 스테판 C. 포스터 310
“큰 목표를 지닌 정신” : 플럭서스, 다다, 그리고 두 가지 속도의 포스트모던 문화 이론 / 니콜라스 저브러그 321
4부 세 가지 플럭서스 목소리
조지 마키우나스와의 비디오 인터뷰 녹취록, 1978년 3월 24일 / 래리 밀러 338
빌리 마키우나스와의 인터뷰 발췌문 / 수잔 L. 자로시 367
어쩌면 플럭서스 (새로운 시대의 변형가, 실험가, 사색가, 총체론자를 위한 준-질문지) / 래리 밀러 390
5부 두 가지 플럭서스 이론
플럭서스 : 이론과 수용 / 딕 히긴스 396
플럭서스와 동료들 / 켄 프리드먼 431
감사의 글 458
기여자들 461
플럭서스 리더 웹사이트 463
정보 및 문의 463
옮긴이 후기 464
글쓴이 소개 467
인명 찾아보기 471
작품 및 용어 찾아보기 475
책 정보
2024.12.12 출간 l 신국판 152×225mm, 무선제본 l 카이로스총서109, Cupiditas
정가 30,000원 | 쪽수 480쪽 | 무게 664g | ISBN 9788961953696 03600
도서분류 플럭서스, 미학, 예술
북카드
구입처
미디어 기사
[새전북신문] 플럭서스에 대한 다각도의 통찰력을 제시한다
[디자인 매거진 CA 278호] 예술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다 «플럭서스 리더»출간